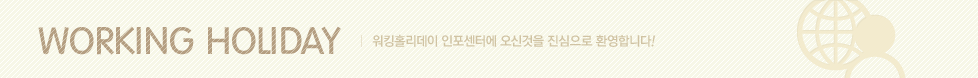
HOME
 |
[워홀in_호남팀]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체와 정신 모두 가장 건강했던 시기 |  |
2017-10-23 10:54 |  |
4737 |
|---|---|---|---|---|---|
 |
인포센터 | ||||
지난 10개월 동안의 호주워킹홀리데이는 내 마음이 가장 편안했고,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시기였다. 그곳에선 내 앞의 행복만 보고 싶었다.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초, 중, 고 시절을 보내온 내가 겪은 호주는 모든 게 너무나 달랐다. 그 다른 것들에서 찾는 사소한 행복이 정말 컸다. 이러한 생활에 적응이 되면 될수록 내 마음은 튼튼해졌다.


▲ 아보카도, 토마토, 올리브오일, 소금 조금 뿌린 토스트 -
흔한 아침식사는 쉐어하우스 발코니에서 Manly, Sydney NSW
아침에 일어나 새파란 하늘을 보고 기지개를 펴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모닝티나 커피를 마시곤 하루를 시작했다. 블루베리, 바나나를 곁들인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든든한 아침으로 먹으며 '오늘의 파도는 어떨까?' 생각했다. 호주에 와서 생긴 새로운 취미 서핑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파도의 높이를 확인하는 웹캠을 보는 게 매일 아침일상이었다. 출근 전에는 나 혼자 먹을 거지만, 나름 정성스럽게 점심 도시락을 쌌다. 오전 레스토랑 웨이츄리스 일이 끝나자마자 도시락을 재빨리 까먹고 자투리 시간에 서핑을 가기 위해서였다.
외식비도 줄일 겸 런치박스를 싸서 다녔는데, 나중에는 도시락 싸기 선수가 돼 있었다. 늦잠을 자더라도 샐러드, 파스타, 샌드위치 등을 재빨리 만들어냈다. 요리를 좀 하시는 우리 엄마였지만 나에게 요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딸내미를 요리 보조랍시고 종종 써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요리에 통 관심이 없는 듯해서 별로 시키지도 않았나보다. 요리에 대한 대화는 "맛이 있다, 없다"가 다였다.
그랬던 나를 외식 값 비싼 호주의 물가가 Sus-chief로 만들었다. 수 쉐프는 주방에서 헤드 쉐프 아래 두 번째 쉐프를 말하는데, 객관적인 나의 요리 실력이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의미다. 워홀러로서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시작했던 홈쿠킹.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다가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와 최대한 똑같이 만들기 시작했다. 먹기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특별한 일이었다. 재료를 마트에서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다. 항상 먹던 식재료였지만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 위해 고르고, 또 고르는 '장보기'는 생각보다 신경을 기울여야 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교육 차원에서 하는 '식재료 가지고 놀기'를 하는 것처럼 다양한 식재료를 성인의 입장에서 탐구해봤다. 좋은 놈을 고르기 위해 레몬의 냄새를 킁킁 맡게 되고, 단단한 토마토를 손으로 눌러도 본다. 이러한 과정이 어색했지만, 이내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의 효능과 궁합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나를 발견했다. 각 식재료에 대한 효능을 알게 되니 먹는 기쁨은 배가 됐다.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아들, 딸에게 많이 하는 얘기,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생활정보프로그램 등에서 "석류는 여자한테 좋데~" "당근이 시력에 좋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곤 했는데 직접 요리하는 사람이 돼보니, 저절로 관심이 갔다. 나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할 생각을 하니, 이왕이면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싶었다. 슈퍼마켓에 가면 오가닉 푸드, 슈퍼푸드 코너에서 한참 동안 가격과 시름하다가 한 개 집어오기도 하고, 저렴한 채소를 사다가 그것의 효능을 배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리하기도 했다. 그렇게 건강한 밥상을 매 끼마다 만들어 먹었다.
가끔 지인들을 집에 초대해 평소에 해 먹던 대로 요리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같이 말했다.
"와, 어쩜 집에서도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어? 넌 정말 셰프야!
"집에서 잘 먹어야지 그럼!"
내 몸과 오직 내 삶을 위해 좋은 것들만 먹으려고 하니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 나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호주의 살 떨리는 대중교통비는 두 다리를 쉴 새 없이 걷게 만들었다. 혼자 쉴 새 없이 걸을 수 있는 것도 이 곳 호주에서는 축복이었다. 멋진 풍경이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으니까.
혼자 온 워홀. 초기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내 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남들이 하던 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던 것들을 찾아 시도했다. 서핑, 요리, 조깅 등. 호주 라이프에서 더욱 더 호주 라이프답게 만들어준, 고마운 나의 취미 서핑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건강한 마음으로 실컷 즐기기만 했던 이 취미는 별 기대하지 않았던 탄탄한 근육들을 내 몸둥아리에 붙여줬다. 11자 복근은 기분 좋은 덤이었다.

▲ 항상 즐기느라 바빠서 몇 없는 서핑 사진. 같이 타는 친구들도 자기 탈 것 바쁨!
서핑을 하면서, 그리고 근교 여행을 하면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그 크나큰 즐거움을 알게 됐다. 즐거움을 주는 자연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나는 초,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웠지만 어느덧 까마득해져버린 자연의 이치가 더 궁금해졌다. 지식인에게, 네이버 검색을 많이 했다. 디너타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몇몇 가로등을 빼면 되게 깜깜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나는 빨갛게 빛나는 화성을 찾았고, 전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별자리 어플리케이션은 어느새 '자주' 쓰는 폴더로 옮겨져 있었다. 문득 이렇게까지 자연에 관심을 갖는 내가 신기했다. 알면 알수록 나의 감각으로 직접 느끼는 자연은 경이로웠다. 별과 달을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주변이 밝아지지 않도록 바랬던 적도 많다. 토끼가 10마리는 들어있을 듯 저렇게 큰 달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저렇게 큰 태양이 동쪽에서 뜨겁게 떠오를 수 있는 지도 호주에 와서 처음 알게 됐다.

▲ 석양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 Manly Sydney, NSW
한국에 있을 때는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몰랐던 것이다.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크고 밝은 쟁반 같은 둥근 달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사실을 저쪽 지구 반대편에 가서야 마침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황홀해했다.
가까이에 있는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시끌벅적한 시내가 아닌 조용한 외곽에서 지내기로 한 뒤부터 마음은 더 편해졌다. 소음공해, 빛의 오염,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곽에서 더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내쉬며 나만의 행복지수를 높여갔다. 하루하루에 지나지 않는 말 그대로 ‘일상’이지만 이토록 행복하다보니 곧 저물어버리는 하루가 아까운 날도 많았다.

▲거울 보다가 내 자신이 너무 건강해 보여서 찍은 셀카. 볼이 아주 똥똥하다.
생각해보니 호주에 있는 동안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단 한 번도 앓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스트레스성으로 가끔 걸리는 부인과 질병들, 생리통, 복통 등. 정말 감사하게도 크게 병원 갈 일도 없고 잔병치레도 거의 없었다. 이게 다 그동안 마음이 건강했던 까닭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매일 아침 화장실도 너무 잘 가서 친하게 지냈던 이탈리안 친구와 진지하게 고민 아닌 고민했던 적도 있다.
마음이 건강하니 몸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선 '사람살기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속으로 달고 지낸다. 그런데 귀국하고 며칠 후 한포진이라는 피부병이 도졌다. 정말 왜 때문일까? 한국 물 때문인가? 호주에서 튼튼하게 지켰던 나의 소중한 마음, 이곳 한국에서도 잘 지켜나가고 싶다.
(작성자 : 워홀프렌즈 6기 김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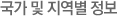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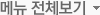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워홀 프렌즈|[워홀in_호남팀]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체와 정신 모두 가장 건강했던 시기](/common/images/title/tit_intro.gif)












